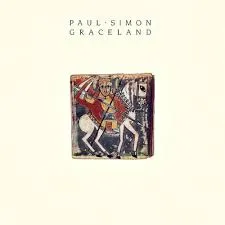UN 제재도 뚫고 아프리카 리듬을 찾아가 만든 '월드 뮤직'
이 음반이 나온 때는 1986년 UN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문화·경제 보이콧을 선언한 시점이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제재를 받게된 것은 그 나라의 전통적인 흑인차별정책 이른바 아파르트헤이트 때문이었다.
그런 정치적으로 예민한 시기에 폴 사이먼은 UN의 시책을 어기고 과감하게 남아공으로 날아 들어갔다. 그의 목적은 그곳의 음악인들과 함께 음반을 취입하려는 것이었다.
반(反) 아파르트헤이트 진영은 분노했다. 아무리 그의 의도가 순수하다 할지라도 남아공의 요한네스버그로 간다는 것은 UN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결국 그것은 백인 지배층에의 협조를 의미한다는 주장이었다. 가나의 UN대사 제임스 빅터 게보는 "폴 사이먼이 남아프리카로 간다는 것은 아파르트헤이트에 무릎을 꿇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게보 대사의 논리는 이러했다.
"그렇게 되면 그는 지정된 백인호텔에서 투숙할 거시고 백인들 소비하는 식으로 돈을 쓰게 될 것이다. 그 돈은 핍박받는 원주민이 아닌 백인들 수중으로 들어갈 것 아닌가. 이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이 남아공에 가선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폴 사이먼(Paul Simon)의 입장은 달랐다. 그는 자신의 남아공 행(行)이 선 시티(Sun City)에서 연주하는 것이 아닐진대 왜들 난리냐는 투였다. 실제로 그는 두 차례 남아공측의 선 시티 연주 초청을 딱 잘라 거절하고 앨범을 만든 뒤 공연수익금을 UN 및 남아공의 흑인 자선단체에 기증했다.
오히려 앨범이 아파르트헤이트 종식을 위한 투쟁에 기여하게된다고 그는 반박했다. 앨범내용에 남아공의 아파르트헤이트에 대한 정치적 견해가 드러나 있지 않다는 비판에 다시 직면하자 그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물론 나의 음악은 정치를 피력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나의 음악이 암시하는 것은 확실히 정치적이다. 난 드러내놓고 얘기하는 것보다 나와 같은 식의 접근이 더욱 강력한 정치적 스타일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부담 없이 나의 음악을 접하게 도리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남아공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느끼게 될 것 아닌가."
앨범 <그레이스랜드>는 이러한 논란의 과정을 거쳐 탄생되었다. 이 음반은 우선 음악팬들에게 미지의 아프리카 리듬이 지닌 우수성을 전파하는 데 공헌했다. 사람들이 남아공 토속음악으로부터 받은 인상은 미국의 리듬 앤 블루스와 비슷하긴 했으나 훨씬 원초적이고 재미있다는 것이었다.
'지성적 음악인' 폴 사이먼의 작품답게 높은 음악적 완성도를 과시하여 그래미상에서 '올해의 앨범'부문을 수상했고 그 덕분에 판매도 호조를 보여 히트 싱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60만장이 팔려나가는 등 상업적으로도 성공했다.
폴 사이먼의 남아공 행에 대한 찬반과 무관하게 이 앨범에 쏠린 관심은 분명히 팝 대중들로 하여금 남아공의 토속음악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아파르트헤이트의 잔혹성을 인식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승리자는 폴 사이먼이었다.
자신이 논란의 소용돌이에 휩쓸리게 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용기를 내도록 만든 것은 84년에 그에게 건네진 <검부츠: 어코디언음악 히트곡 2집>(Gumboots: Accordian Jive hits Vol.2)라는 이름이 음반사 표시도 없는 카세트였다. 정체도 모르면서 폴 사이먼은 그것이 주는 멜로디에 끌려 멜로디를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나중 그는 검부츠가 므바캉가(Mbaqanga)라는 남아공 스웨토의 거리음악인 것을 알게 되었다.
사이먼은 급기야 남아공의 프로듀서인 힐튼 로센탈과 접촉했고 직접 요한네스버그로 날아가 그곳의 토속음악인인 타오 에아 마체카, 제네랄 MD 시린다 앤드 가자 시스터스 그리고 보요요 보이스 등 3그룹과 손잡고 레코딩 작업에 착수했다. 타오 에아 마체카는 '거품의 소년(Boy in the bubble)'에, 제네랄 MD 시린다 앤드 더 가자 시스터스는 '난 내가 아는 것을 안다(I know what I know)', 보요요 보이스는 '검부츠(Gumboots)'에 각각 독특한 리듬과 하모니를 들려주었다.
남아공 세션을 마친 뒤 기악 트리오인 레이 피리(기타) 바기티 쿠말로(베이스) 아이삭 므찰리(드럼)와 함께 뉴욕으로 돌아온 그는 그들의 도움 속에 타이틀 곡 '그레이스랜드'와 '아프리카의 하늘 아래(Under African skies)'를 녹음했다. '아프리카의 하늘 아래'에는 린다 론스태드가 싱어로 참여했다. 서방 음악인으로는 그녀 외에도 로스 로보스(Los Lobos)가 가세해 앨범에 로큰롤적인 요소를 불어넣는 데 기여했다(나중 로스 로보스는 작곡에 자신들의 이름을 뺐다고 폴 사이먼을 고소하려 했다).
이 앨범의 꽃은 무반주 합창 즉 아카펠라인 '집없는 사람들'(Homeless)이란 곡이었다. 사이먼과 남아공 아카펠라 그룹인 레이디스미스 블랙 맘바조(Ladysmith Black Mambazo)의 리드싱어 조셉 샤바랄라가 공동 작곡한 이 노래는 사이먼의 가사와 줄루(Zulu)족 언어가 완벽한 앙상블을 이루고 있다. 여기서 마치 한 사람의 소리나 같은 레이디스미스 블랙 맘바조의 보컬 하모니는 경탄을 자아낸다. 이와 함께 남아공 흑인들의 고된 삶을 은유적으로 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앨범 수록곡 가운데 가장 정치적이기도 하다.
'강풍이 우리집을 파괴하고 많은 사람이 죽는다. 오늘밤 네가 당할 수도 있다. 우린 집 없는 사람들이야. 달빛은 심야의 호수에 잠들고….'
<그레이스랜드>는 무엇보다 알려지지 않았던 아프리카 음악을 세계인들에게 알리는데 결정적 계기를 만들었다. 제3세계 음악을 일컫는 '월드 뮤직'의 붐 속에서 그것은 음악 팬들을 부분적으로나마 앵글로 색슨권 팝 음악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었다.
그러나 서방인이 주체가 되어 아프리카 음악을 소개한 것이 과연 진정한 월드 뮤직인가는 의문으로 남는다. 만약 그렇다면 월드 뮤직이란 어휘는 중심이 제3세계에 위치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가치가 떨어진다. 더불어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점에 '오로지 음악에 가치를 두고' 제재망을 뚫고 음반을 완성한 행위가 그 우수성으로 인해 칭찬만 받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여전히 논란거리는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