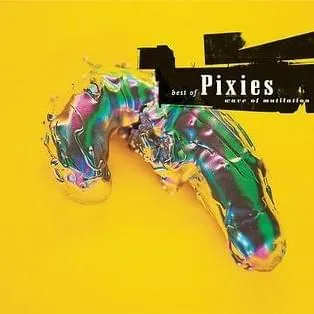첫 인상은 나쁘지 않다. 픽시스의 전형대로 잘 짜인 멜로디와 과거 얼터너티브 신을 연상케 하는 사운드 톤이 잘 맞물려 있다. 전반의 컬러는 23년 전의 전작인 < Trompe Le Monde >의 ‘U mass'와 닮아있다. 그런 점에 있어 음반의 시작을 알리는 ’What goes boom'은 잘 뽑아낸 트랙이다. 흡인력 있는 리프와 훅이 돋보이고 블랙 프랜시스의 스크림과 거침없이 긁어대는 조이 산티아고의 기타 연주가 예의 모습을 기억 속에서 꺼내온다. ‘Jamie Bravo’와 ’Magdalena 318'도 마찬가지. 팬들이 사랑해마지않던 픽시스의 펑크 록 사운드가 이 지점에서 멋지게 떠오른다. 훌륭한 송라이팅은 ‘Green and blues'와 ’Indie cindy'와 같은 트랙들에서도 유효하다. 단번에 귀에 박히는 선율은 더 없이 훌륭한 이들의 장점이다. 부담 없이 흐르는 ‘Green and blues’에서의, 가볍게 오르는 ‘Indie cindy'에서의 후렴구는 묘미로서 음반을 충분히 빛낸다.
허나 분명 문제점도 있다. 아니, 문제점이 사실 더 크다. 이는 픽시스가 단순히 곡을 잘 쓰는 팝 펑크 밴드가 아니라는 데에서 출발한다. 훌륭한 작곡 능력만큼이나 실험의 면모에서도 남다른 역량을 보여줬던 이들이다. 예상 지점을 우회하는 전개와 재치 있게 도발하는 노이즈야말로 밴드의 음악을 결정하는 또 다른 정의 아니었던가. 아쉽게도 이번 음반에서는 위의 매력을 찾기 힘들다. 변칙을 설치한 진행이 곳곳에서 눈에 띈다마는 재미없는 억지 구성에 가깝다. ‘Indie cindy’는 어울리지 않는 두 선율이 등을 맞댄 듯하고 ‘Snake’는 이렇다 할 응집력 없이 사운드가 산발하는 형상이다. 그루비한 비트로 시작하는 ‘Bagboy’도 그저 그런 시도로 남겨두는 게 좋겠다. 게다가 작년 밴드에서 탈퇴한 베이시스트 킴 딜의 공백도 꽤 크다. 악기 구성에 있어 전면에 배치될 정도로 공격적이었고 또 매혹적이었던 그 베이스 라인들이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사라졌다. 음반을 뒤덮다시피 거칠어진 기타 톤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된다. 이쯤 되면 나와야할텐데 싶은 킴 딜의 목소리도 기대하지 말자. ‘Gigantic’도 ‘Debaser’도 이 음반엔 없다.
그럼 2014년의 픽시스, < Indie Cindy >를 어떻게 바라봐야할까. 영광의 주역들에게는 으레 특혜나 후광이 따라붙는다지만, (물론 특혜와 후광 모두 픽시스와 어울리는 것들은 아니다) 그 관습에서 이번 음반은 논외로 두어야겠다. 듣기 좋은 곡들이 포진돼있다 해도 전과 같은 발랄한 재기가 없다는 사실은 어딘가 작품을 공허하게 만든다. 머릿속에 맴돌게끔 구축한 멜로디는 좋다. 허나 곡의 단위로, 앨범의 단위로 논점을 끌어올렸을 때 그것 외에 딱히 설명할 게 없다면 이는 분명 맥이 빠지는 결과다. 디스코그래피를 재개해준 데에는 감사를 표해야겠다. 욕심 가득한 픽시스의, 블랙 프랜시스의 행보가 여기서 끊이지 않으리라는 것은 분명하니 말이다. 조금은 허무한 복귀작이다. 리뷰도 이쯤에서 찜찜하게 끝내야겠다.
-수록곡-
1. What goes boom [추천]
2. Greens and blues [추천]
3. Indie cindy
4. Bagboy
5. Magdalena 318
6. Silver snail
7. Blue eyed hexe
8. Ring the bell
9. Another toe in the ocean
10. Andro queen
11. Snakes
12. Jaime Brave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