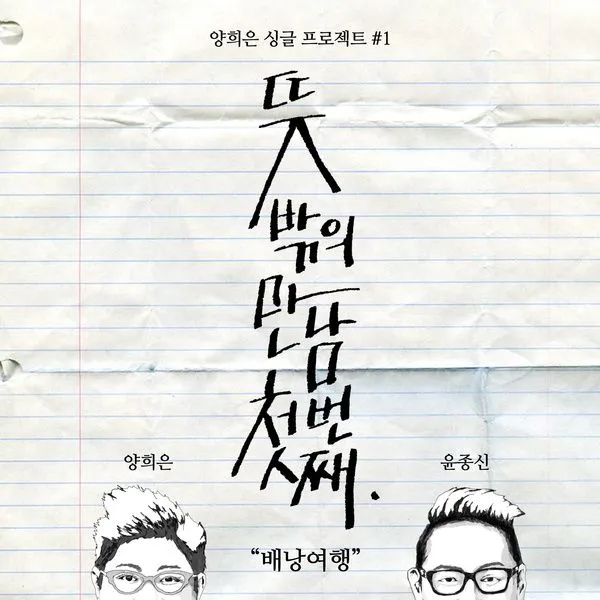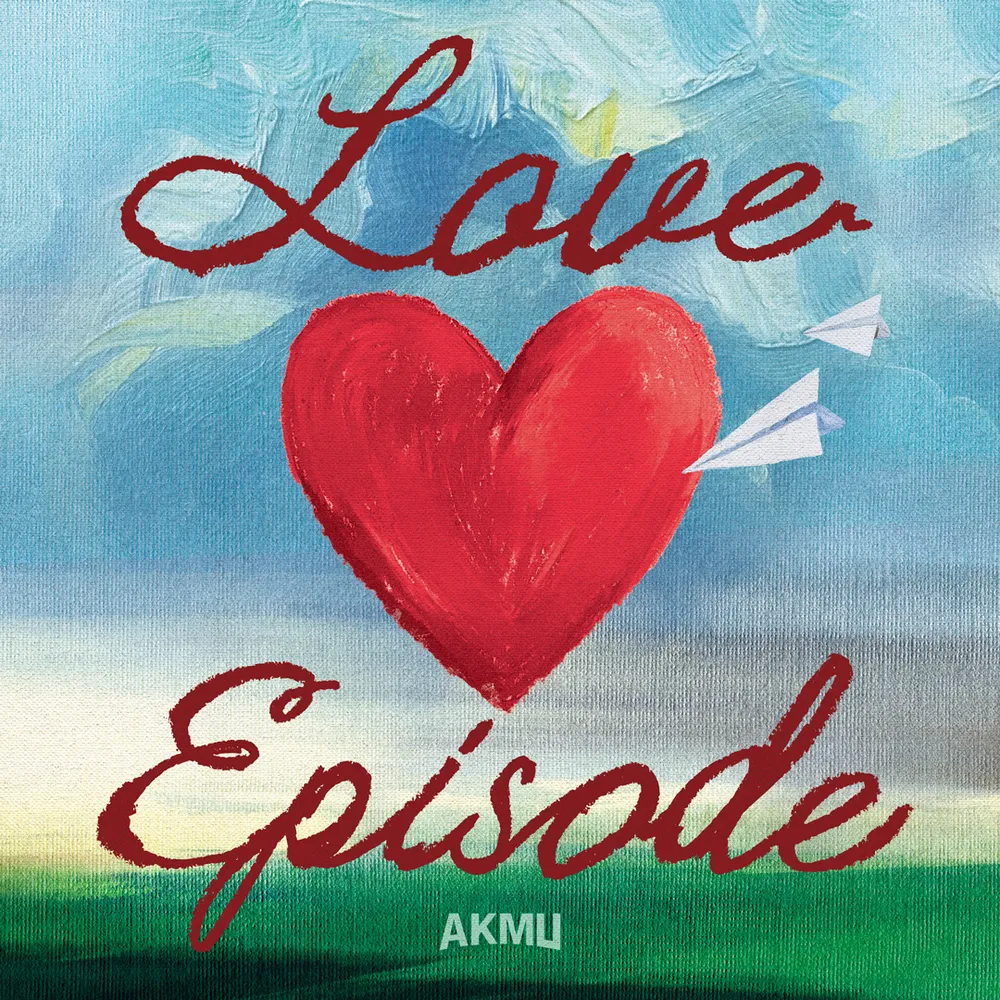‘뜻밖의 만남’이지만, 양희은과 악동뮤지션이 입을 맞춘 모습은 자연스럽다. 한국 포크의 상징과도 같은 뮤지션과 현재 메이저씬에서 어쿠스틱 기타를 잘 활용하는 팀의 조합은 음악의 색채를 놓고 봤을 때 이질적이지 않으니까.
중점은 선배가 후배에게 맞추느냐, 후배가 선배에게 맞추느냐인데, ‘나무’는 이찬혁이 곡을 썼음에도 양희은에게 맞춰졌다. 여기서 아쉬움이 발생한다. 이찬혁은 곡의 프로듀서까지 맡았음에도 ‘양희은’이란 대가에게 지나치게 초점을 맞춘 나머지 본인의 장점을 많이 표현하지 못했다. 그렇다고 양희은이란 대명사가 적극적으로 활용된 것도 아니다. 양희은에게 어울릴만한 옷을 만들었지만, 막상 입히니 태가 나지 않는 상황이다.
선배는 후배에게 많은 권한을 부여했지만, 아직 프로듀서로서 이찬혁의 경험은 부족한 것으로 느껴진다. 물론 그 대상이 양희은이기에 그럴지도 모른다. 그 누가 감히 그녀의 진가를 쉽게 풀어낸단 말인가. 이런 점을 모두 따졌을 때, 이번 프로젝트는 조금 설익은 만남이지 않나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