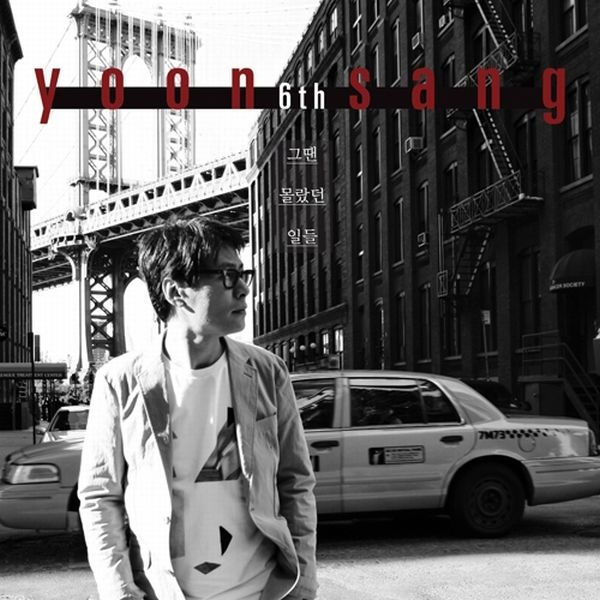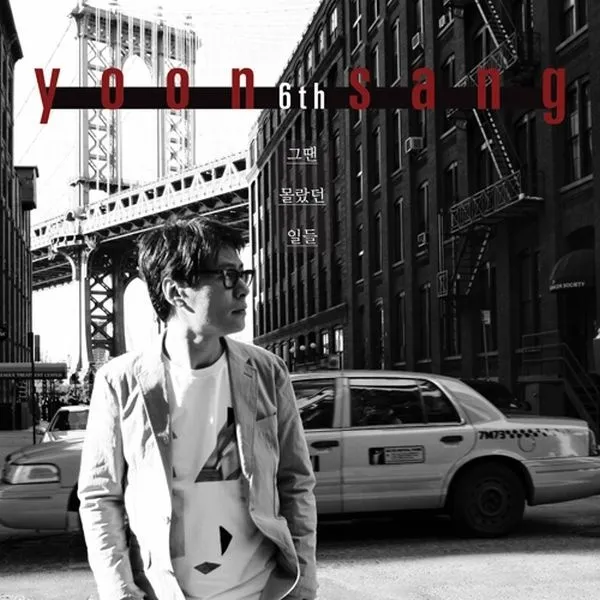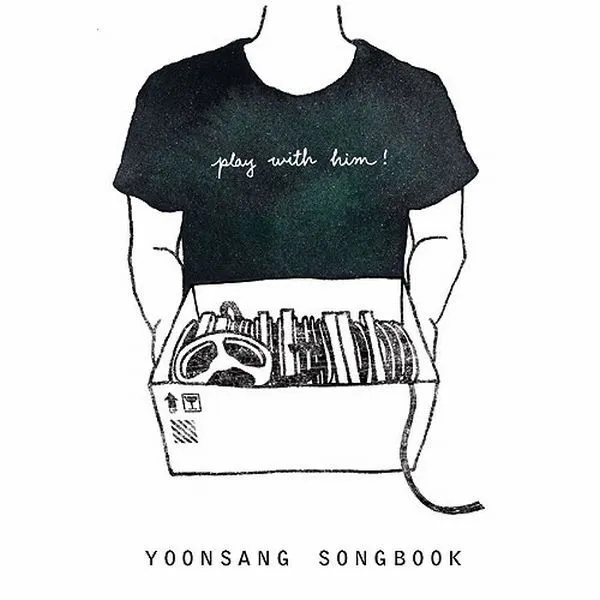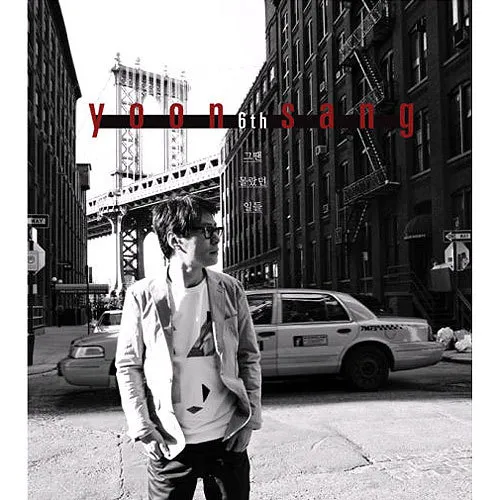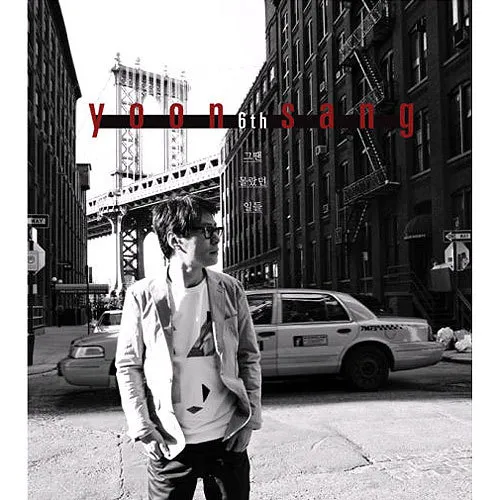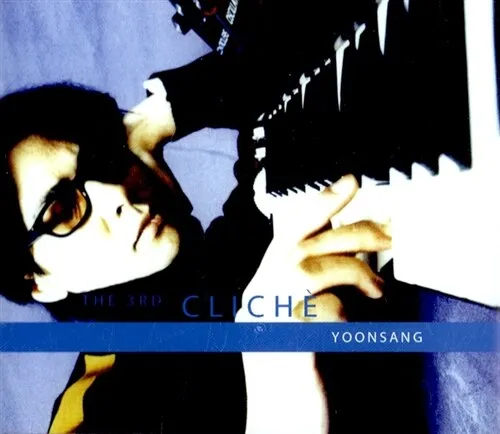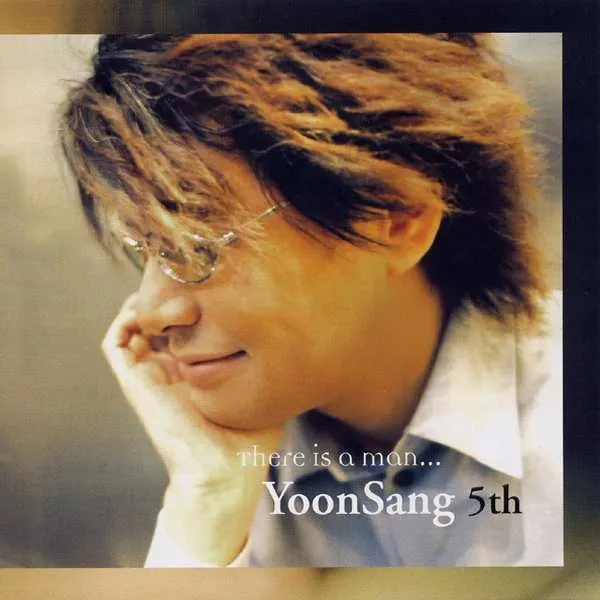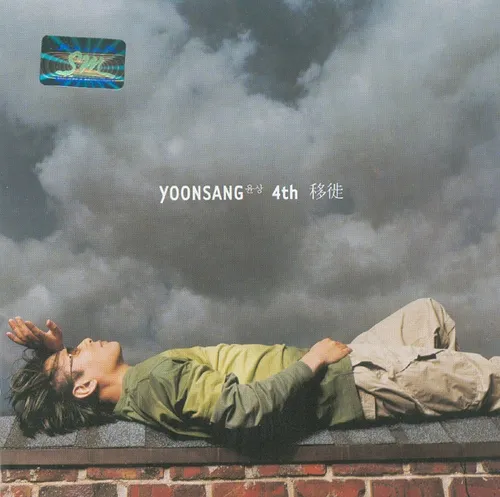조아름 정규앨범으로만 따지자면 6년만이다. 감성어린 터치와 여심을 자극하는 목소리의 주인공은 그 마니아층이 이미 두텁다. 무난한 미성의 발라드 가수였던 그를 독보적인 뮤지션의 위치로 올려놓은 것은 신시사이저다.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윤상만큼 신시사이저의 능력(?)을 잘 끌어올리는 사람은 몇 되지 않는다는 말이 나돌았을 정도.
이제는 슬쩍 발을 뻗기만 해도 차일 정도로 흔해진 일렉트로닉 사운드지만 호흡이 느껴지는 곡을 만나긴 여간해선 쉽지 않다. 마치 진공상태의 방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듣는 이의 몸에 먼지 하나라도 붙어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부자연스러움을 윤상의 곡에선 찾아볼 수 없다.
리듬은 변화무쌍하게 춤추며 귀를 자극하지만 어디까지나 멜로디 아래에 있다. 잠깐의 코러스를 제외하면 화음을 깔아주는 악기 하나 없이 온전히 목소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치했다. 어찌 보면 리듬과 보컬이 전부라 할 수 있을 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겁거나 모자란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 것을 보면 감탄이 나올 수밖에. 촉촉이 물기를 머금은, 설득이 필요 없는 곡이다.
김아람 6년 만에 돌아온 윤상은 자신의 색깔을 더욱 공고히 했을까. 아니면 미국에서의 유학길을 감행했던 것처럼 새로운 시도를 감행했을까. 답은 ‘어느 한 쪽도 치우치지 않고 두 가지 모두를 적절히 담아냈다’이다.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 ‘그 눈 속엔 내가’를 플레이하는 순간 ‘뿅뿅’대는 신디사이저 소리를 앞세운 일렉트로니카가 사운드가 귀를 사로잡는다. 흡사 전작 ‘이별없던 세상’이 떠오르기도 한다. 조금은 장난스럽고 가벼운 편곡이 의도적인 것으로 읽힐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얄밉게 들리지 않는 것은 윤상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세련된 멜로디와 편곡의 힘 때문이다.
테크닉적인 부분과는 별도로 ‘윤상’표 정서는 여전하다. 윤상의 음악을 좋아하는 이들은 단순히 음악을 잘 만드는 것을 넘어서는 윤상만의 무언가에 대한 향수가 있을 것이다. ‘그 눈 속엔 내가’에서는 그 무언가가 담겨있다. 윤상만이 보여줄 수 있는 세계를 그리워하는 이들에게는 반가운 음악이 아닐 수 없다.
옥은실 몽롱함이 베어나는 미디엄 템포의 전자음 위로 흐르는 맑은 목소리가 매력적이다. 전자음향이 곡의 7할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전만큼 낯설지는 않다. ‘이별의 그늘’ 이후로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한 그다. 발라드와 일렉트로닉, 월드 뮤직 등 다양한 분야를 오가며 실험적인 음악을 선보여 왔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그가 대중과는 꽤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그런 그가 대중을 향해 진일보 한 곡을 내놓았다.
‘그 눈 속에 내가’는 지난 그의 음악에 주를 이루었던, 다소 지나치게 느껴지기도 했던 프로그래밍이 상당 부분 완화되었다. 가사집을 찾아보지 않으면 제대로 알아듣기 힘들었던 노랫말도 잘 들리는 우리말과 서정적인 것으로 돌아왔다. 도시적이고 이국적인 그만의 색채가 곡 전반에 유지되는 것 또한 반갑다.
대중으로 하여금 자신의 음악을 다른 음악으로부터 낯설게 했던 종전의 감각을 유지하되 대중을 품을 수 있는 곡이 완성됐다. 때문에 윤상의 초기 시절을 기억하는 팬들 그리고 윤상이라는 가수를 잘 알지 못했던 사람들도 함께할 수 있는 앨범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