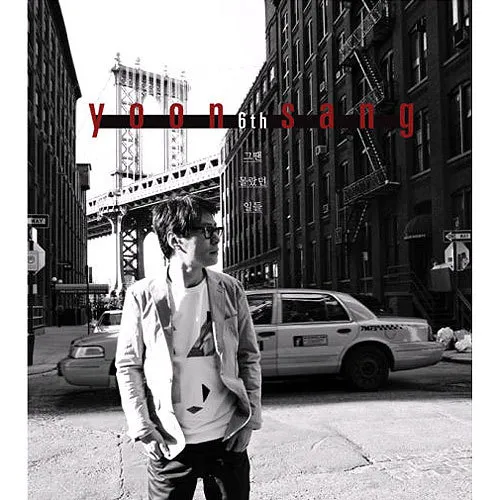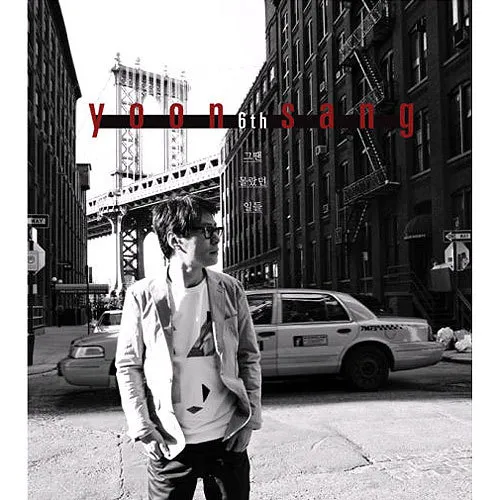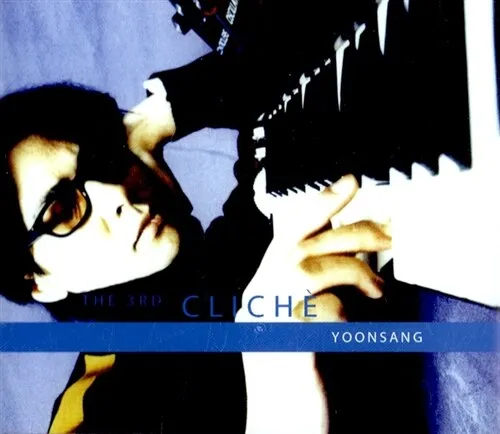처연하게 가라앉는 스트링, 격정적 드라마의 복선인 한 마디의 내레이션 ‘미안해’, 결국 터져 나오며 감정을 극으로 몰아붙이는 고풍스런 기타 솔로까지. 의심의 여지는 없다. 2012년의 월간 윤종신 10월호를 설명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키워드가 있다면 그것은 오로지 ‘신파’뿐이다.
애초에 신파를 목적으로 했다면 그것이 그저 지나간 촌스러운 유행의 환기에 머물렀느냐, 혹은 예스러움을 멋스럽게 잘 살렸느냐가 판단의 기준으로 작용할 텐데, 신곡은 연주의 맛을 충분히 살린 덕분에 전자의 수준을 아슬아슬하게 비켜가고 있다. 밋밋함 속에서 이내 주의를 집중시키는 조정치의 기타 연주가 한 몫 했다. 비애감 넘치는 플레이는 흡사 게리 무어(Gary Moore)의 그것을 연상하게 한다.
냉정한 듯 빈틈 많은, 혹은 빈틈 많은 듯 냉정한 윤종신의 이미지와도 궁합이 잘 맞는 곡이다. 두 중년 남성의 트렌치코트 룩은 제목처럼 나쁘지 않았다. 멜로디 흡인력만 좀 더 있었더라면 ‘결코 나쁘지 않았더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