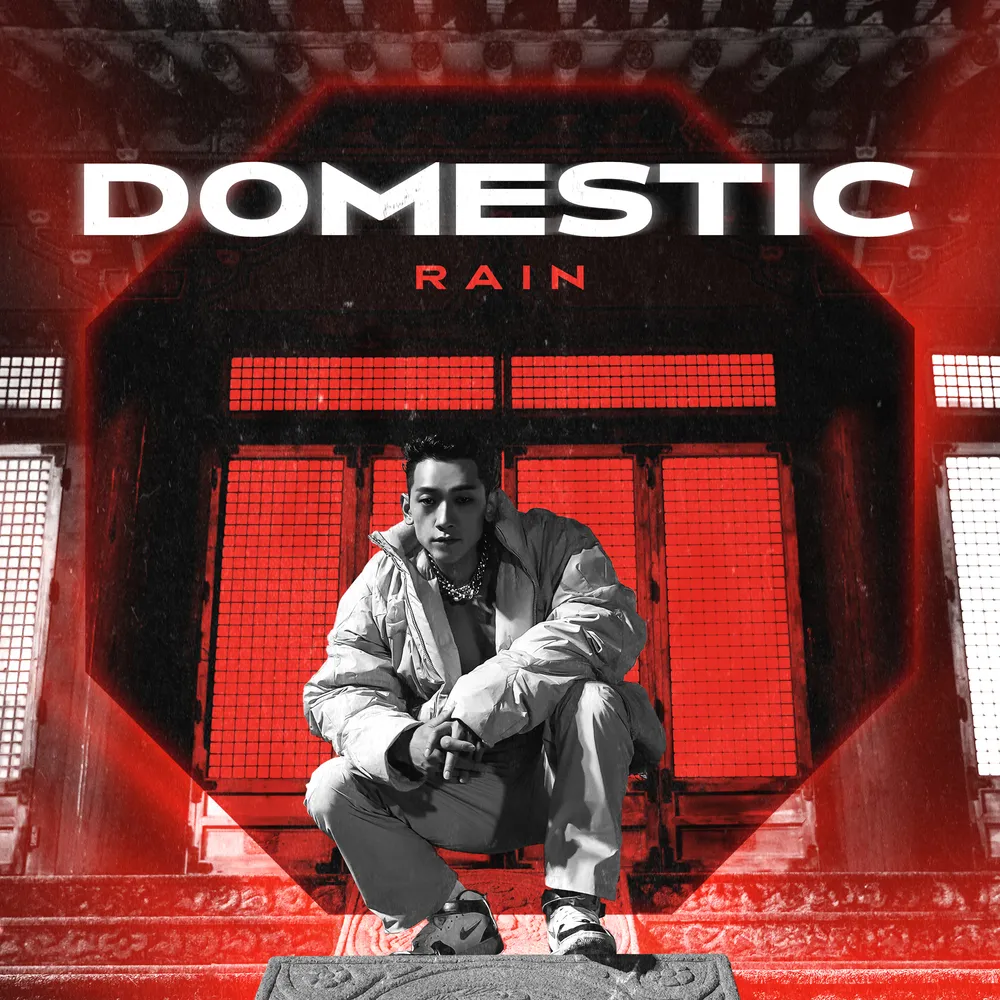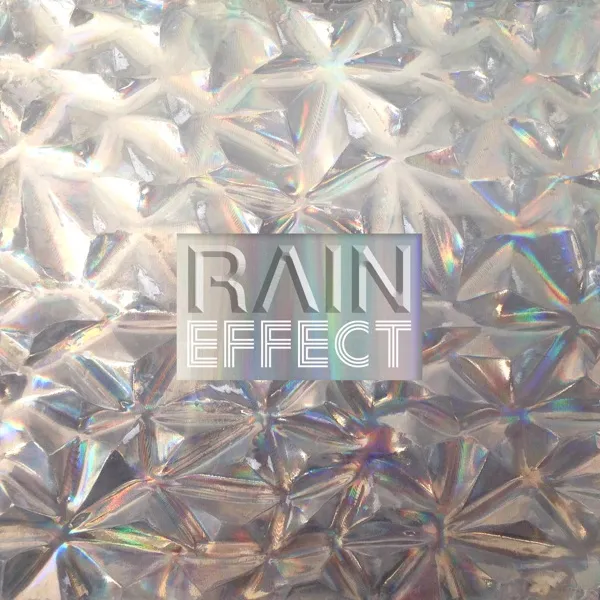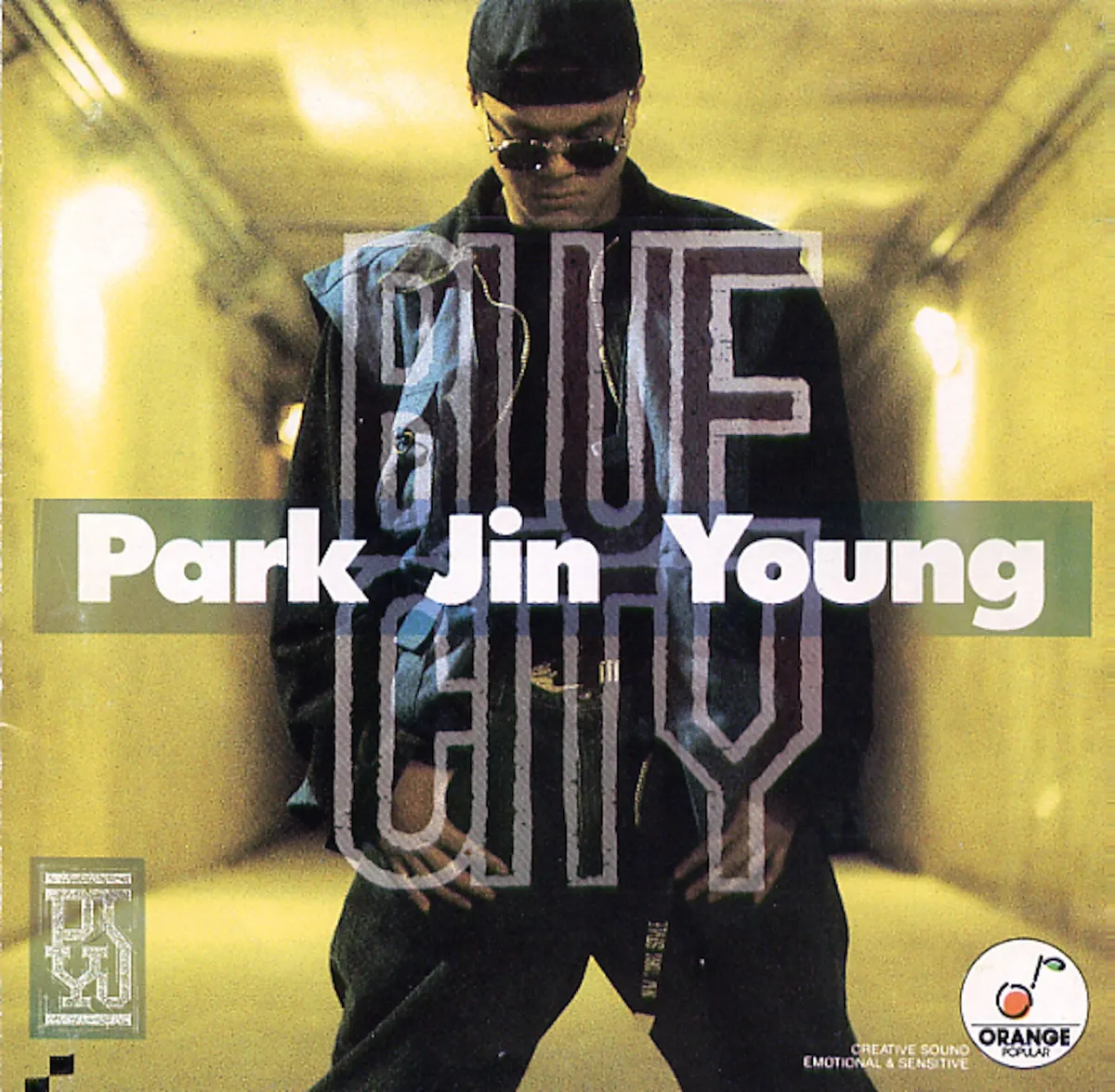사실상 실패가 힘든 조합이다. 의도치 않은 ‘깡’의 재조명부터 프로젝트 그룹 ‘싹쓰리’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한 비, 그리고 최근까지도 ‘When we disco’ 등의 복고풍 곡으로 꾸준히 자신의 커리어를 이어온 박진영의 재회라니. 틱톡을 이용한 신세대적 홍보나 각종 예능 프로그램의 지원 사격을 빼놓을 수 없을지라도, 이들과 동시대를 보냈다면 이 만남이 자아내는 강한 호기심과 추억의 동요만큼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90년대 뉴 잭 스윙 스타일을 그대로 가져온 음악은 진부한 도그마만이 가득하다. 건재하고도 강렬한 퍼포먼스 역시 과거의 산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전형적인 피아노 도입부는 물론, 이후 터져 나오는 테디 라일리(Teddy Riley)식 드럼 루프와 댄서블한 신시사이저 전부 과거에 둥지를 깊게 틀고 있으며, 시대를 역행하는 랩 파트는 그 투박함에 쐐기를 박는 요소다.
과거로의 회귀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다. 정녕 복고 흐름에 탑승하고 옛 영광을 호출하려는 의도였다면 치밀한 준비가 행해졌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래 박진영의 복귀를 위해 제작된 곡이라 할지라도 색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듯한 비의 투입은 과적 요소로 다가오며, 현대성과의 교류를 일절 반영하지 않은 작법 또한 발전적 요소 없이 답습에만 의존할 뿐이다. 결국 남은 것은 화려한 뮤직비디오 속 값싼 노스탤지어뿐, 감각과 스타성이 달력에 갇힌 것만 같아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