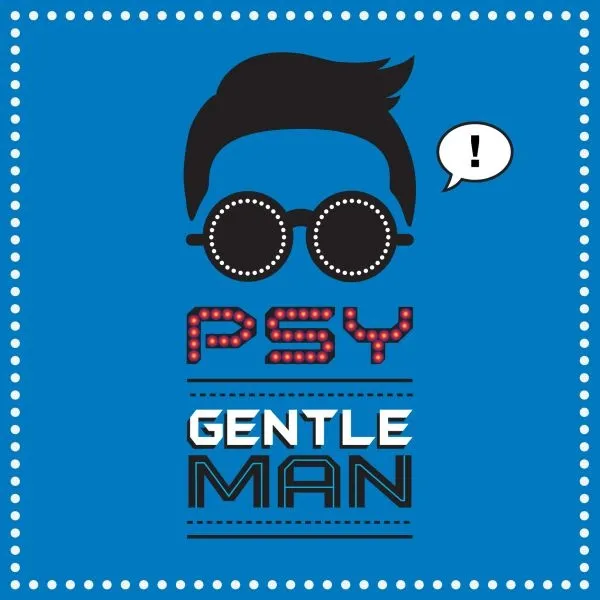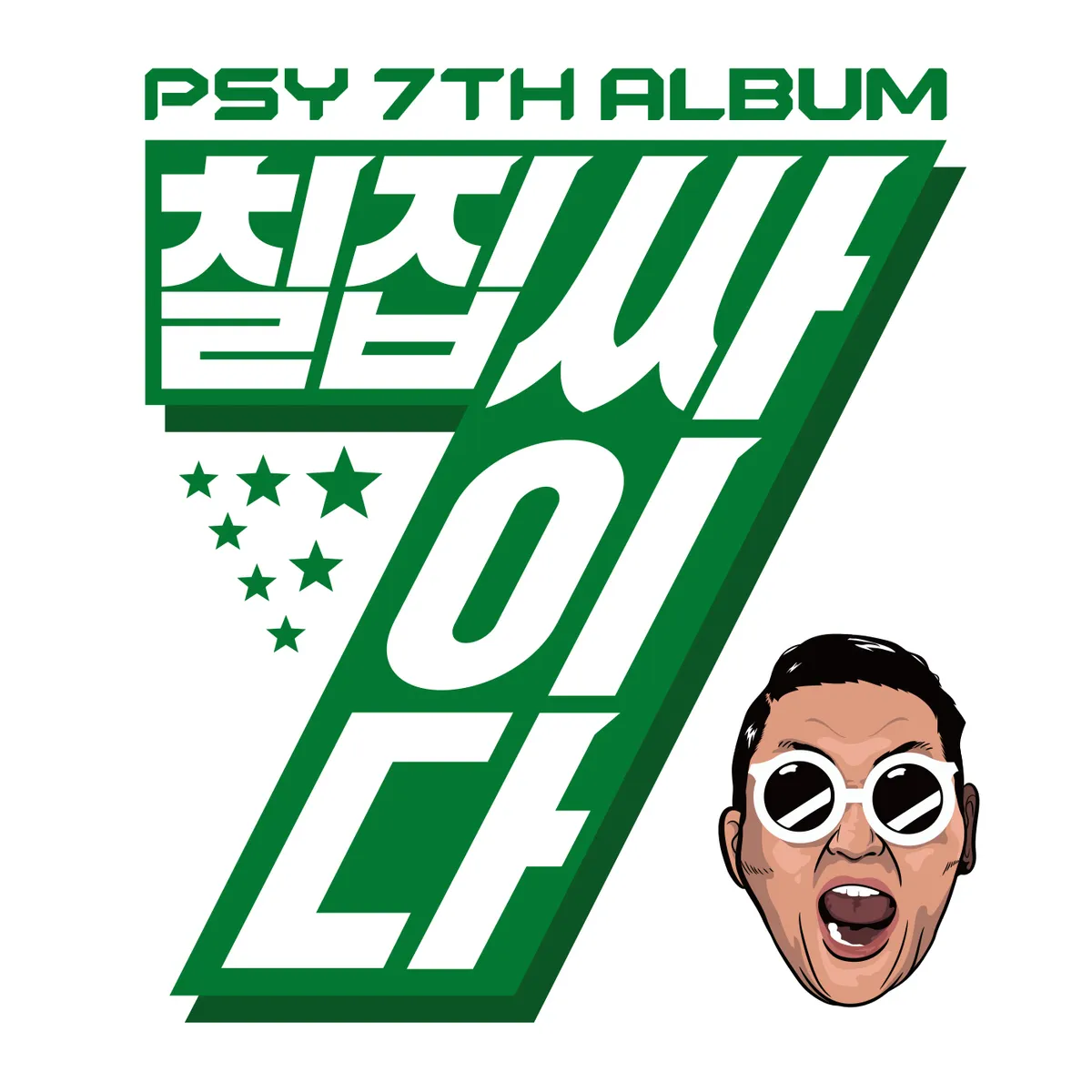철저한 ‘수출용 트랙’이다. 첫 인상만으로 기존에 보여주던 ‘B급 정서’의 실종을 논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결과다. 이 곡 만큼은 그간 국내 활동을 통해 쌓아온 캐릭터가 아닌, ‘강남 스타일’이라는 곡으로 규정지어진 ‘국제 가수’ 이미지의 연장선상이어야 했기 때문이다. 예기치 못한 이 한 번의 무국적 히트가 그에 대한 관심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킨 상황에서, ‘엽기 바이러스’를 다시 한 번 확산시키기 위해 필요했던 것은 다름 아닌 해외 시장을 향한 전략적인 치우침이었다.
그래서 국내에서 유효하게 쓰이던 ‘Right now’ 식의 후렴구 장착 대신 적극적으로 사용한 것이 바로 ‘강남 스타일’이 제시해 ‘Harlem shake’가 증명한 ‘함께 춤 출 수 있는 클럽튠’이라는 공식이다. 보컬과 멜로디를 가급적 배제한 채 댄스플로어를 서서히 달구어 폭발시키는 과정에 많은 부분을 할애한 모습은 분명 전작과 동일하다. 여기에 좀 더 주안점을 둔 것은 바로 전세계인들이 함께 입 맞추어 소리 낼 수 있는 후크. 둥둥대는 베이스와 여전히 활개치는 신스 루프가 만들어 낸 아드레날린의 산을 오르는 동안, ‘알랑가 몰라’, ‘말이야’, ‘Mother, father, gentleman’ 등의 단어를 반복시키며 21세기형 구전가요를 표방하는 모습이다.
본능에 물들여진 비트는 노랫말과 손뼉을 맞추며 흡사 총을 장전해 트리거를 당기기까지의 긴장감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데 성공한다. 어느 때보다 가늠하기 힘든 ‘대중의 평균치’라는 짐을 짊어진 와중에 그가 꺼내든 카드가 새로운 무언가에 대한 강박관념이 아닌, 기존의 메뉴에서 껍질을 바르고 거친 부분을 다듬어 알맹이만을 내놓는 세심함이었다는 점이 일종의 반전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이제 안무와 뮤직비디오가 이 2차 공습의 파괴력을 얼마나 극대화시키는지 지켜보는 것만 남았다. ‘원 히트 원더’라는 이름의 굴레, 그 궤도의 이탈도 꿈만은 아닐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