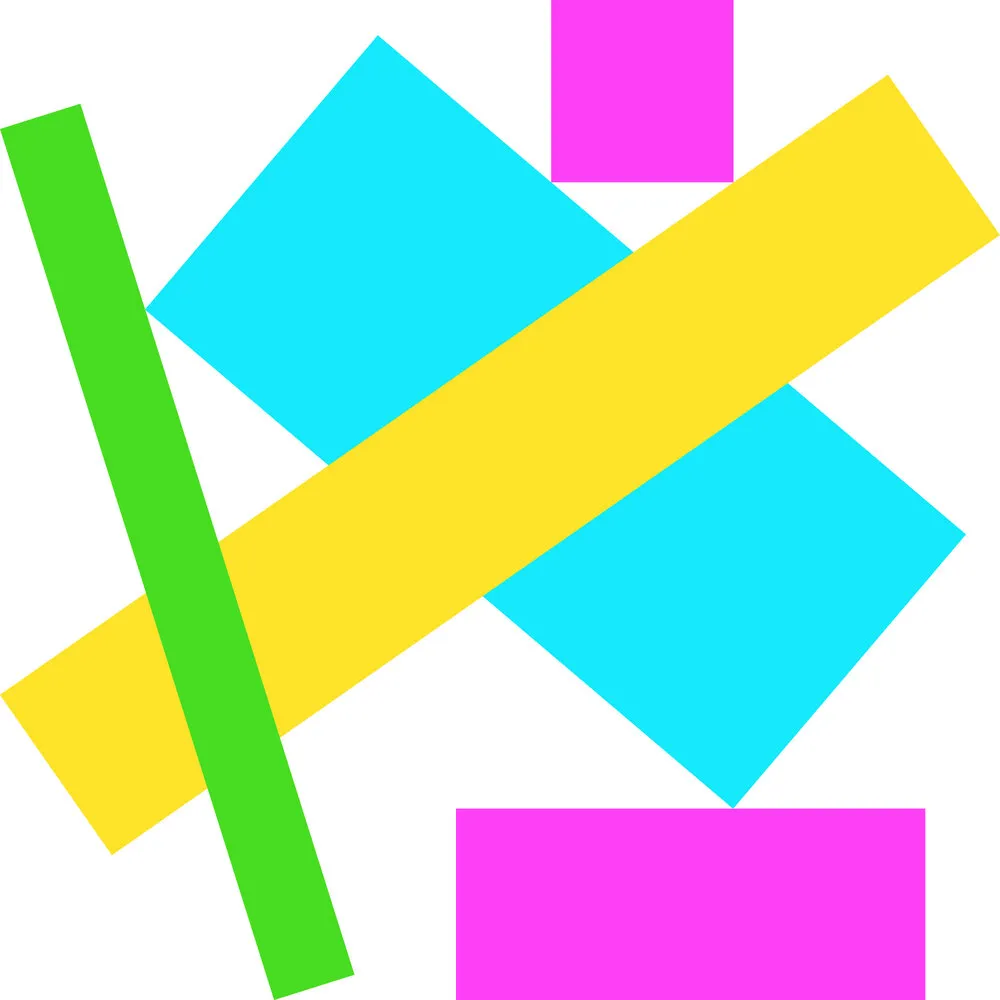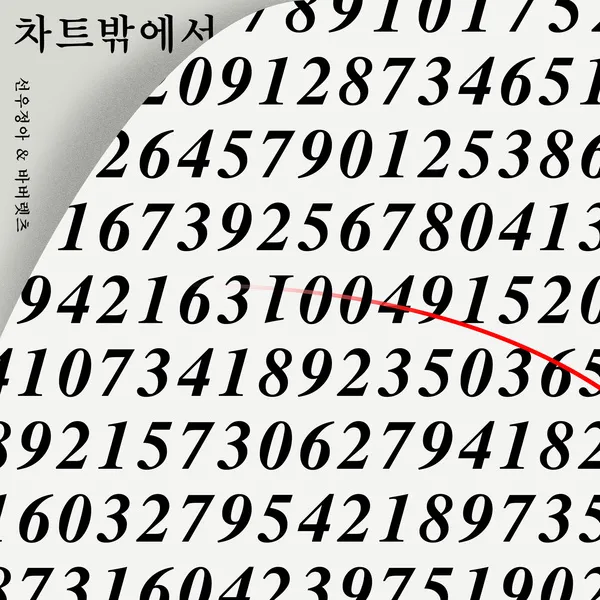세상만사 편하게 살면 좋을 텐데 그러기가 참 쉽지 않다. 그럴 때는 우주를 떠올려 본다. 깜깜하고 생명 하나 찾기 힘든 미지의 공간이라 하더라도 그곳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 선우정아에게도 이 생각은 마찬가지였나 보다. 우주를 콘셉트로 잡은 < 너머 [1. Black Shimmer] >는 뮤지션 자신이 사랑했고, 또 스스로에게 상처를 준 것들을 연료 삼아 무한한 공간으로 나아가는 앨범이다.
다섯 곡으로 러닝타임이 짧은 탓에 옴니버스식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그는 두 축으로 정렬한다. 하나는 옛 영웅을 향한 경의 표시다. 곡 설명부터 프린스와 샤카 칸을 언급하는 ‘별사탕’은 1980년대 알앤비에 대한 애착을 발산하고, 음반 내에서 가장 적막한 ‘부른 소리’에서는 쓸쓸한 데이비드 보위를 소환하는 식이다. 트랙 간 느슨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그는 가장 싱어송라이터 적인 방식으로 묶고 조이며 영감의 궤도를 형성한다.
또 다른 축은 안에서 밖으로의 운동 방향성이다. 꾹꾹 눌러온 분노를 내뱉는 ‘What the hell’과 헐떡임 증세를 치유하는 듯한 ‘Shimmer’ 등 크고 작은 분출의 모티프가 음반을 지탱하고 있다. 기존 음악과 달리 그의 목소리는 희뿌연 안개와 먼지에 휩싸여 있으나 대담해진 감수성으로 스스로를 해부하여 내핵을 드러낸다. 데뷔 이래 줄곧 자기 이야기를 해온 사람에게 새삼스러운 말일 테지만 시선의 부재 하에 다시 한번 ‘나’다워지는 것이다. 재즈 보컬리스트로 출발한 그의 종착역은 당연히 ‘Jazz box’. 안락한 재즈 속에서 그는 해방의 환희를 누린다.
정규 앨범의 첫 절반으로 공개한 만큼 거대한 콘셉트를 온전히 담아내기에는 러닝타임상 이야기가 뚝 단절되는 감이 있다. 전작 < Serenade >같은 분할 공개를 선우정아가 굳이 고집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살짝 황급히 끝나는 아웃트로에 12인치 믹스를 요구하게 되는 ‘별사탕’은 짧은 들숨과 날숨보다 선우정아에게는 긴 호흡이 더 어울린다는 또 다른 신호일 지도. 물론 이미 빠르게 준비 중인 두 번째 파트를 궁금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신보는 대제목 ‘너머’처럼 맡은 소임을 다한다. 다만 그가 품은 상상력에 약간의 공간적 여유가 더 필요하다는 의미다.